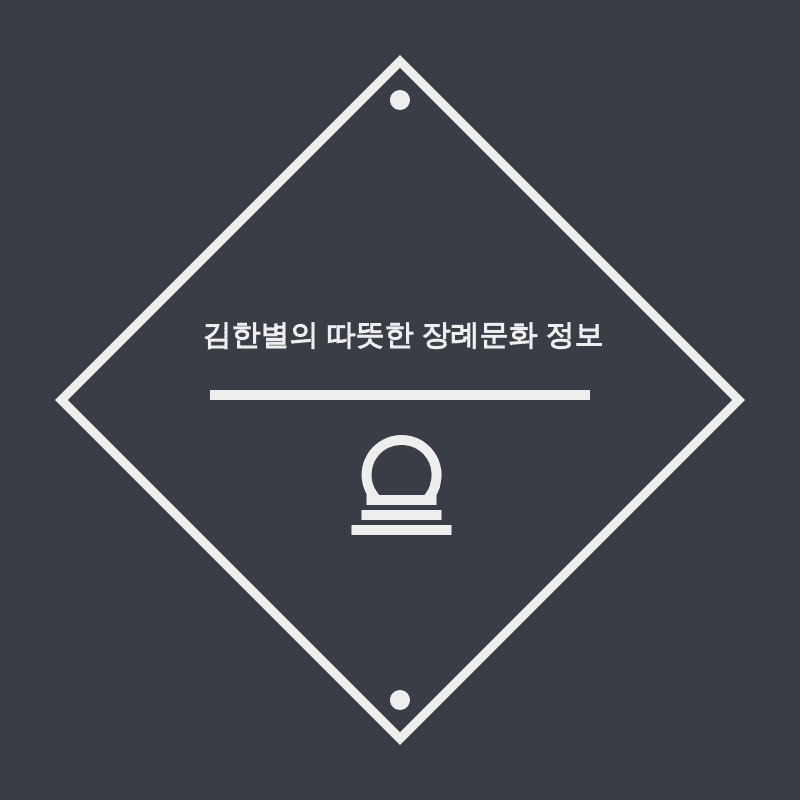-
부모님의 유언이나 가족들의 의지에 따라 고인의 유골을 산골 하는 경우가 있다. 사실 산골이라는 장례문화는 우리의 전통 장례문화가 아니다. 우리의 전통 장례문화는 매장이다. 그렇다면 산골이라는 장례문화가 왜 생기게 되었으며 산골이 과연 우리에게 좋은 장례문화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사실 산골 장례문화는 우리나라에 화장이 대중적으로 도입되면서 생겨났다. 화장은 고려시대에 주로 행해지던 불교식 장례 풍습이다. 고려시대 당시 화장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목재가 필요했기에 고위 계층에서만 이루어졌던 고급 장례문화였다. 그런데 고려시대가 막을 내리고 조선이 건국되자 유교가 성행했고 불교는 억압되었다.
유교가 국가 정치사상의 근본이었기에 유교식 장례인 매장이 대세 장사문화가 되었다. 이 장사문화는 1990년대까지 대세 장사문화로 이어져 왔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국토가 묘지화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국가 차원의 장례 문화의 변혁이 일어났다. 바로 화장문화의 장려였다.
국가에서는 화장을 장려하기 위해 노력했고 이 노력은 대중들의 인식 속에 심어지기 시작했다. 결국 이제는 대세 장례문화가 되었다. 지금의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90% 이상의 국민들이 화장으로 장례를 치르고 있다. 화장의 문제는 화장한 유골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남은 것이다.
국가에서는 그 방법을 봉안당과 봉안묘 등의 봉안시설로 해결하려 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바로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었다. 물론 공설 봉안당이 존재하지만 이에 대한 홍보와 국민들의 인식은 매우 미흡했다. 이 과정에서 산골이 탄생하였다.
또한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자연으로 회귀한다는 뿌리 깊은 전통 정서와 맞물려 산골이 점차 늘어났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유가족들이 산, 들, 강과 바다 등 아무 곳에나 산골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식적인 산골시설 유택동산을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여기까지가 우리나라 산골 문화의 근현대사다. 어떤가? 좋아 보이는가? 개인적으로는 아니다. 왜냐하면 산골을 하게 되면 유가족들이 고인을 추모하고 기억할 수 있는 장소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성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게 과연 유가족들이 바라고 당사자가 원하는 상황일까?
아닐 것이다. 장례 문화의 본질은 기억이다. 다른 단어로 바꾸어 설명하자면 추모이다. 고인과의 생전 추억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사랑을 마음속에 새기며 사는 것이 추모이다. 그런데 산골을 하게 되면 고인을 기억할 수 있는 장소가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 이 점이 핵심이다.
산골을 하고 안하고는 물론 당사자와 유가족의 결정이다. 그래도 여러 번 생각해 보길 권면한다. 후손들이 관리하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설 봉안당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 찾아가서 추모하는 관리가 부담스럽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후손들은 추모를 통해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하고 삶의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리고 그 문화는 이어져 내려간다. 우리가 우리의 기존 역사를 버리면 안 되듯이 우리의 장례 문화도 버리면 안 된다. 산골은 장례 문화를 버리는 행동이다. 그래서 생각해봐야 한다. 우리가 가진 참된 가치를 지켜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말이다. 자연으로 돌아가길 원한다면 장지가 있는 자연장을 선택하면 되는 것이다.'장사문화'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성묘의 참된 뜻과 방법 (0) 2022.06.17 매장과 화장의 의의와 장단점 비교 (0) 2022.06.16 고인을 꼭 윤달에만 이장해야 할까? (0) 2022.06.14 문상할 때 어떤 옷을 입고 가는 게 좋을까? 정장 vs 평상복 (0) 2022.06.13 자연장할 때 고인 유품을 함께 묻어도 될까? (0) 2022.06.05
김한별의 따뜻한 장례문화 정보
김한별의 따뜻한 장례문화 정보 블로그는 장사법, 장사시설, 장사 문화, 장사행정, 반려동물 장례 등의 장사 관련 전문 정보를 제공합니다.